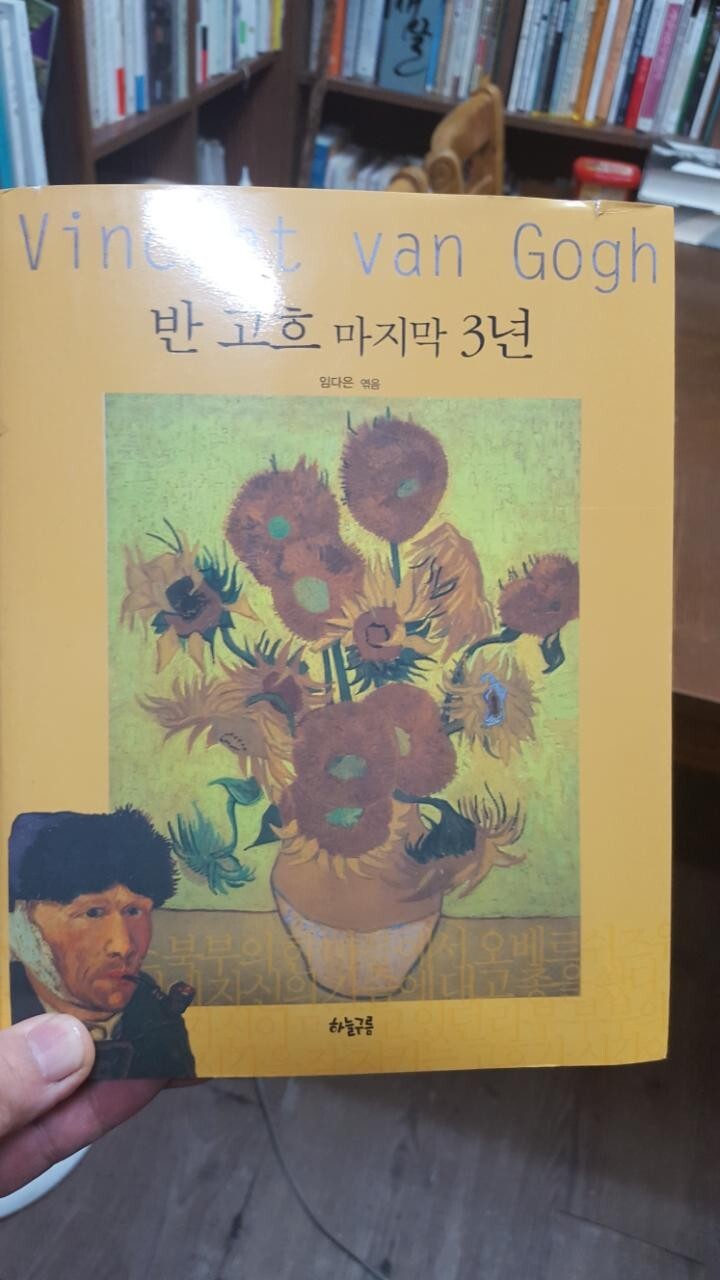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해바라기 sunflower
그리고 내 친구 고흐
해바라기에 얽힌 나의 짧은 이야기를 남기려 한다. 내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밝힌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을 간다. 그리고 인생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조기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공자님도 [삼세지습이면 지우팔십]이라고 하였다.
(오늘 내가 운영하는 글짓기 모임에 아뜨리에 선생님이 올려주신 댓글을 보고서, 불현듯 해바라기에 대한 글을 남기고 싶어졌다)
[수선화]라는 시로 유명한, 천재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네"라는 명싯구를 남겼다.
하지만 나는 "밭가의 해바라기를 볼 때마다 내가슴이 뛰네"라는 패러디성 싯구를 남기고 싶다.
지금도 나는 해바라기를 볼 때마다 봄처녀처럼 가슴이 설레인다. 물론, 해바라기는 8,9월에 꽃을 피우고, 10월이면 1000여개의 해바라기씨를 먹을 수 있다. 그런 생물학적인 모습도 무척 매력이 있는 식물이 해바라기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그 이름도 무척 예쁘다.
길가나 밭둑가에 자라는 해바라기는 그 자체로 어여쁜 아가씨를 닮았다. 그래서 나는 그 해바라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진다. 그 이유는 아버지 덕분이다. 해바라기를 처음 본지 40여년이 지났어도 나는 이 해바라기에 철사줄처럼 꽁꽁 묶인 사람이다.
공주사범학교를 나와 한문선생님 이셨던 아버지는, 유독 해바라기를 좋아하셨다. 아버지는 넓은 시골집의 작은 정원 테두리를 해바라기로 심으셨다. 집에는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액자가 걸려 있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고흐의 '노란색'에 대한 강렬함이 내 뇌리에 남아 있다. '노란색'은 나의 평생의 색이다. 노란색을 보면 고흐의 [해바라기]를 떠올린다. 난 4,5살 어려서부터 해바라기를 보면서 자랐다. 동네어귀에 나가보면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무수히 서있었다.
아버지는 왜이리도 해바라기를 좋아하셨을까?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 집 뒷편에는 약 2-30 그루의 해바라기가 늘 자랐고, 아버지는 로멘티스트로 8,9월에 피는 해바라기를 자주 구경하시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해바라기씨를 받아서 말리시곤 하셨다. 아버지는 봄부터 자라는 해바라기의 크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하셨고, 정성껏 가꾸시는 모습이 기억이 난다.
집안에는 위에서 말한대로 , 고흐의 [해바라기]작품들이 몇 점 걸려 있었다. 3작품이 다 고흐의 것이어서, 나는 어려서부터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시골초등생때 선생님이 고흐의 작품을 화보로 가져온 적이 있는데, 누구의 작품인지 아냐고 물었는데, 피카소도 몰랐던 나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선생님께서는 나를 신기한 학생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공부는 꼴찌인데, 고흐를 알고 있었으니...
고흐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전기문에서 잘 나온다.
고흐는 1888년 8월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 "나는 오로지 커다란 해바라기로만 아틀리에를 꾸미고 싶다"고 썼다.그는 프랑스 남부 아를에 있는 노란 집에서 친구 폴 고갱의 도착을 기다리는 중이었다.그는 단 일주일 만에 해바라기 그림 네 점을 완성하기도 했다.생전에는 이것을 판매하지 못했지만 사망한 후 점차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재미가 없지만, 이해를 더하기 위한 옮긴 글이므로 그리 신경쓰지 마시라)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신 작품은 [열두송이의 해바라기]이다. 이 작품은 1888년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으로, 독일 뮌휀 노이에 피나코텍에 전시되어 있다. 따뜻한 햇볕이 있는 남부 프랑스에서 고흐는 고갱과 함께 쓸 작업실을 장식하기 위해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파란색과 녹색 바탕위에 선명한 노란색의 해바라기, 고흐는 강렬한 색채의 대비가 돋보이는 해바라기 그림을 열정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했다. 생전에 고갱은 고흐의 그림을 탐냈다고 한다. 노란색은 인상파의 색이다. 그 색을 고흐는 평생동안 그린 것이다. 그의 그림으로 인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과 작가들, 기업들이 푹 빠져 있는 것이다.
그후 이 작품은 우리 집에 20년 이상 걸려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교내사생대회가 열렸다. 미술수업을 제대로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틈틈히 붓글씨와 산수화를 배우기도 하였다. 덤벙대고 철이 없지만 집중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좋아하셨다. 그리고 미술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지만 늘 까부는 모습에 그리 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미술시간은 모두 여학생들의 독차지이다.
그런데 그 사생대회에서 내가 대상을 받았다. 4절지에 크레파스로 나는 고흐의[열두송이의 해바라기]라는 작품말고, [두개의 해바라기가 있는 정물]이라는 작품을 연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1887년 그린 그 작품에서는 두개의 해바라기가 나란히 놓여져 있으며, 해바라기를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묘사한 작품이다. 나는 그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나만의 해바라기를 그려갔다.
고흐의 그림이 어린이에게는 그리기 쉬운 그림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림 가득 해바라기를 그려 넣었다. 노란색과 푸른색 크레파스로 그린 나의 그림은 금방 선생님의 눈에 띄었다.
미술 선생님은 "이 그림을 네가 어떻게 아니?" 라고 물어 보셨고, 나는 "우리집에 고흐라는 사람의 작품이 몇개 걸려 있어요"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셨나보다" 라는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림실력이 부족한 나였기에, 다른 그림을 잘 그리는 '윤미영'이라는 친구가 해바라기 옆에 붙어있는 둥근 잎새들을 그려 주었다. 그 그림은 유리액자에 담겨 초등학교에 보관되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마치기까지 그 그림을 보았다.
그후 나는 고흐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었고, 고흐의 그림에 늘 매료가 되었다. 후기인상파를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가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시고, 실제로 마당에 핀 해바라기를 좋아하셨던 것은 어린 나의 가슴에 좋은 교육이 되었다.
그후 해바라기를 여러번 그려 보았다. 대학때도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 보았다. 지금도 해바라기를 그리라면 잘 그릴 자신이 있다. 나는 아직도 해바라기를 사랑한다. 길가에 해바라기가 피어나는 계절이 다가온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해바라기를 멋드러지게 찍고 싶다. 그리고 캔버스에 해바라기 유화를 한 점, 올 가을에 그리고 싶다. 고흐처럼 노란색이 좋아졌다. 고흐는 세월을 뛰어넘는 내 친구다.
난 가끔씩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에 간다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가왕 조용필의 ㅡ 킬리만자로의 표범ㅡ 이다. 그 노래 랩부분에 '고흐라는 사나이'가 나온다.
본인은 처절하게 불행했지만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든 그 고흐가 보고 싶다. 이 글을 쓰면서 그에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진다.
고흐에 대한 글과 그림은 무수하게 많다. 그가 무엇을 했으며,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인간 고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고흐의 글중에서,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내용이 인상적이다.
"새들은 털갈이를 하지, 솜털이 떨어져나가고 억센 털이 돋아나는 거야.
사람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불운과 불행의 시간이 있는 법이야.
털갈이를 마다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털갈이를 겪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모든 고통을 혼자서 겪어내는 것도 배워야지.
삶은 허투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니까,
문든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어.
만약 그럴수가 있다면 말이야"
고흐는 "불행이 나만 따로 비켜가지 않는군" 이라고 자책도 한다.
고흐의 고백은 그 당시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고백이다.
그 당시는 질병과 고통을 받는 시대였다.
그럼 지금도 고통과 불행이 비켜가는 시대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도 고통의 순간이 오고, 불행이 손님처럼 찾아오는 시대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인문학적인 순간, 인간적인 순간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고흐의 고통을 생각해 본다. 그가 만든 모든 작품들은 다 고통의 산물이다.
그 시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도 해주지 않았다. 다만 그저 동생 테오를 통해서 그림을 팔았고, 그의 고통도 팔린 것이다.
산고끝에 나온 그의 작품은 죽은 후에 크게 인정받는다.
고흐는 고통과 광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천재적인 작품들을 만든다.
광기와 천재성은 서로 연관이 깊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고통이 들어간다.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위대한 것은 없다.
아이를 낳은 어미의 산고의 고통은 깊고 크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을 인하여서 고통을 크게 잊는다.
아마 고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림 그리는 순간만큼은 고통도 잊고,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거장이 되어
자신만의 인상적인 그림을 그려낸 것이다.
고흐라는 이름에서 고통이 느껴진다.
인간 고흐라는 사람에게도 연민을 크게 느낀다.
그래서 나는 피카소보다 고흐가 더 좋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면서 시인 윤곤강의 [해바라기]를 남긴다.
벗아! 어서 나와
해바라기 앞에 서라.
해바라기 꽃 앞에 서서
해바라기 꽃과 해를 견주어 보라.
끓는 해는 못 되어도,
가슴엔 해의 넋을 지녀
해바라기의 꿈은 붉게 탄다.
햇살이 불처럼 뜨거워,
불볕에 눈이 흐리어,
보이지 않아도, 우리 굳이
해바라기 앞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해를 보고 살지니,
벗아! 어서 나와
해바라기 꽃 앞에 서라.
2018년 강연 글 소개

고흐의 책을 사진 찍다 !!
'명작과 고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길묻82, <축의 시대> 칼 야스퍼스와 케렌 암스트롱 (1) | 2022.10.10 |
|---|---|
| 명길묻81, <1984>외 조지 오웰 다시 읽기 (1) | 2022.10.10 |
| 미술인문학, 베르메르, 진주 귀고리 소녀, 1666년 (0) | 2022.10.09 |
| 명길묻80,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인문학의 발자취 (3) | 2022.10.08 |
| 명길묻 79, 리윈탕, 자연스런 인생의 흐름 (0) | 2022.10.08 |